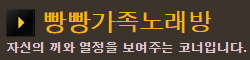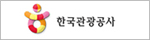돌 잔 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4-01-15 11:16 조회488회 댓글0건본문
오늘은 동생의 손녀 돌잔치 날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형제자매들과 창원, 강원도 등 먼 곳에 있는 친척들 그리고 고향 분들까지도 참석하여 “명품 웨성프로 3층 글로리”는 하객들로 붐볐다.
동생의 손녀는 노란 색동저고리에 진분홍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조바위를 씌우고 발에는 간편하고 곱게 만든 타래버선을 신었다. 그리고 돌띠를 두르고 오복주머니를 옷에 달고 있었다.
동생은 풍성하게 차린 돌상 앞에 폭식한 방석을 깔아놓은 자리에 손녀를 앉혔다.
빠른 것이 세월이라더니 쌕쌕 코골며 내 잔등에서 자던 동생이 어제 같은데 56년 지나 오늘은 할아버지 노릇을 하게 된 것이다.
순간 나의 머리 속에서는 착잡한 상념과 더불어 흘러간 세월의 옛 추억들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1968년 겨울이였다. 하교 후 집안에 들어서니 어머니께서 아래 배를 부둥켜 잡고 구들에서 진땀을 흘리는 것이였다.
《엄마, 엄마... 왜 그래, 응?》
나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어머니를 부여잡고 엉엉 울었다.
《둘째야, 울기는... 어서 큰엄마한테 찾아가 보라》
《엄마, 큰엄마는 의사도 아닌데 찾아서는... 》
《애도, 참 엄마 말을 들어야지. 어서 빨리... 》
《응,》
나는 문을 열고는 큰엄마 집으로 달려갔다.
《큰엄마, 우리 엄마 배... 배 아프다고 큰엄마 찾아가라고 해요.》
《뭣... 뭐라고? 어머니가 배 아프다구.》
큰엄마는 깁고 있던 헌 옷을 한쪽에 밀어 넣고는 문을 나서 잰걸음으로 나를 앞세우고 집 뜨락에 들어섰는데 이게 웬 일인가?
《으앙, 으앙!》 갓난 애기의 울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여 나왔다.
《쯔쯔... 동서가 아이를 출산하였구나!》
큰엄마는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잽싸게 흙 버치에다 물독에서 물을 펴 담아가지고는 집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것이였다. 나는 발볌발볌 앞으로 걸어가 살며시 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섰다. 베게모양의 꼼지락 꼼지락 하는 것이 바로 갓 태어난 동생이였다. 큰엄마는 동생을 안고 물 담은 흙 버치에서 동생의 온 몸을 씻어주는 것이였다.
《동서, 고추가 달렸소.》
《형님, 그러나 저러나 저것 때문에 난 큰 걱정이예요. 마흔이 넘어서... 》
어머니는 기뻐할 대신 한숨만 짓는 것이였다. 큰엄마는 동생을 깨끗이 씻고는 옷으로 벌거숭이 동생을 감싸여 어머니 옆에 눕혀 놓고는 부엌에 내려가 불을 피웠다.
《둘째야, 헛간에 들어가 아침에 삶은 시래기를 가져다 큰엄마 주거라.》
《엄마, 열흘 전 아버지가 미역을 사왔는데... 》
《애두, 참 그 미역은 너의 형수 아기 낳을 때 사돈집에 보내야지.》
《엄마도, 참...》
나는 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헛간에 들어가 삶은 시래기 한 덩어리를 가져다 큰엄마에게 주고는 장작개비를 한 아름 안고 부엌에 들어서서 쪼크리고 앉아 아궁이에 쑤셔 넣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께서는 동생을 낳고는 시래기 국을 드시였다.
늘그막에 낳은 자식은 더 곱게 기른다고 하지만 나의 동생은 오히려 고생 속에서 자라났다. 보름이 지나자 형수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사돈집에서 기별이 오자 형님은 미역보따리를 어깨에 지고 그날로 처가 집으로 갔다.
20일이 지나자 형수는 조카를 업고 나의 집에 왔다. 공수벌이가 제일 좋은 겨울이라고 형수는 이튿날부터 생산노동에 나섰다. 그러자 어머니는 조카를 등에 업고 10식구의 때 식을 끊여 먹였다.
밤마다 조카의 어린손이 자기 어머니의 부푼 젖가슴을 물고서 오물오물 하면서 한 손으로 다른 젖꼭지를 만질 때 나의 동생은 어머니의 빈 젖을 빨다가는 울고 울다가는 빨았다.
《왜, 밤마다 못살겠구나.》 하면서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이슬같은 눈물이 두 뺨으로 대르륵 굴러 젖꼭지를 문 동생의 뺨에 떨어진다. 어머니께서 동생의 뽀드라운 살 위에 떨어진 눈물방울을 씻으며 또 떨어지면서 어머니의 따뜻한 눈물은 동생의 얼굴을 곱게 씻어 주었다.
《엄마, 내가 동생을 업고 잠 재울게.》
《응, 그래라. 엄마는 졸음이 오누나.》
어머니는 동생을 나의 등에 얹어 놓았다.
나는 동생을 업고 방안을 거닐면서 《자장자장/ 나의 동생/ 잘도 잔다./ 》 나의 자장가 노래에 동생은 스르르 잠이 들 군 하였다. 나는 동생이 배고파 울면 화로 불에 감자를 구워서는 껍질을 벗기고는 동생에게 주었다. 동생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감자를 받아서는 입안에 밀어 넣는다.
봄이 되자 어머니는 젖꼭지에 고추 가루를 발랐다. 나중에 천으로 젖꼭지를 봉하였다. 매일 어머니는 일군들을 일 밭으로 보내고는 조카를 등에 업고 남새밭에 나가기에 동생은 집안에서 혼자 수수삿자리에서 벌벌 기다가는 울고 울다가는 자는 것이였다.
어느 하루 하교 후 집에 들어서니 동생이 마루 바닥에 떨어져 《엄마, 엄마...》 하며 먼지 묻은 손을 허우적거리며 울고 있었다. 동생이 걸음발을 탈 무렵이 되자 수건을 동생의 겨드랑이 밑에 든든히 매여놓고 참을성 있게 방안에서 동생을 끌고 다니면서 걸음 연습을 시켰다.
《형님,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가족사진을 찍어야죠.》
동생의 말에 나의 쓸쓸한 추억의 꿈은 깨여졌다.
《형님, 앞자리에 앉으세요.》
나는 동생의 고집에 못 이겨 앞자리에 앉았지만 사진을 찍는 것보다 그 어떤 생각이 가셔지지 않았다.
동생의 돌 생일 아침이였다. 그날 어머니는 시래기 밥을 하지 않고 입쌀밥을 하였다.
《오늘 막내 생일에 돌상에 무엇을 놓아줄까?》 어머니는 주밋 주밋 망설이다가 농 밑굽에서 실타래를 꺼내 동생의 목에 걸어주었다. 나는 책가방에서 교과서, 필갑통, 연필 그리고 십전을 돌 상우에 놓았다.
동생은 아장아장 걸어가더니 돌 상우에서 연필을 쥐는 것이였다.
《엄마, 동생이 연필을 들어.》
《아니, 막내가 공부를 잘하겠나.》
어머니는 주름진 눈 굽을 메마른 손가락으로 비비며 웃었다.
《형님, 사진을 찍었어요. 저 1호 식탁으로 갑시다.
《아니, 벌써 사진을 찍었다고.》
《형님, 무슨 근심이 있소.》
《아니, 그저.》
동생이 어찌 내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아, 동생아 얼마나 많은 시름과 슬픔 사연들을 너는 어찌 생각이나 하랴. 이 날에 한 입이 아니고 서너 입이라도 너에게 하소연을 못 다할 것 같다.
얼마 후 식탁에 음식들이 들어왔다. 돼지고기, 소고기볶음, 물고기, 낙지회, 새우냉채, 갈비 찜, 해삼냉채가 상다리 부러질 정도였다.
동생 손녀의 돌잔치는 풍성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더 풍성한 것은 아마도 손녀의 성장이 주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한다.
/신석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