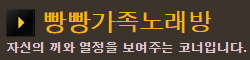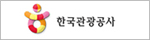우리말과 형수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2-10-26 17:10 조회610회 댓글0건본문
올해 78세이신 형수님은 고향에 계시면서 나와 위챗으로 우리말로 꽤 긴 글과 대화로 주고 받곤 한다.
57년 전 한족동네에서 자라신 형수님은 형님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어머니는 일년 전 목화를 물레에 돌려 뽑은 자연실로 베틀에 걸어 무명을 짰다. 그 무명필을 나의 집 뜰 안으로 들어오는 100미터 길에 깔았다. 10살 인 나는 그 모습이 부끄러워 먼발치에서 바라 볼 뿐이었다. 꽃마차는 나의 집 양철 대문 앞에서 멈춰섰다. 형수님이 꽃마차에서 내리더니 사뿐사뿐 무명을 밟으면서 집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밥상에 앉았지만 자연스럽지 못하고 얼굴이 화끈거렀다. 곁눈질로 형수님을 살짝 쳐다보니 보름달처럼 환하였다. 그때 어머님은 “둘째야, 형수에게 인사 하거라.”라고 말씀 하셨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나는 모기소리를 내며 겨우 인사를 하였다. 형수님은 나의 말을 들은둥 만둥 별 느낌도 없이 나를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러자 형님이 형수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자 형수는 어설프고 우스운지 나의 손을 잡고 “소쑤지, 쎄쎄, 쎄쎄.”하며 중국말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하교 후 한족아이들과 놀았기에 한족 글을 쓸 줄 모르지만 한족말로 대화할 수 있었다.
“둘째야, 형수가 뭐라고 말하니?”
중국말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어머니가 궁금하여 묻는 것이었다.
“엄마, 적은이 고맙다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 답답한 일이네.” 하시는 어머니의 한탄소리가 들렸다. 처음 보는 형수님이지만 행실이 넉넉하신 것 같아 앞으로 가족을 편하게 해주는 분이라고 느끼었지만 우리말을 한마디도 들을 줄 모르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보다 집안의 대사나 친척들이 모였을 때 우리말이 필수이기에 형수님이 벙어리로 살아가야 하는데 걱정이었다.
어는 날 밤 어머니는 나를 앉혀놓고 “둘째야, 형수에게 조선말을 배워 주거라.”
“엄마, 난 싫어 형이 있는데...”
나는 거절하였다.
“애야, 형수가 일상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조선말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형수는 언젠가 어머니의 자리라, 네가 철들면 알거야.” 그 말씀에 나는 “응, 엄마.”라고 대답하였다. 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우리말을 배워줄 수 없고 어머니는 중국말을 한 마디도 모르시고 형님은 생산대장이여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고 여동생은 네 살 이기에 초등학교 4학년이 내가 형수님에께 우리말을 가르치게 되었다. 나는 형수께 우리말 자모나 글자를 가르쳐 드리지 않고 우선 “아버지, 어머니, 남편, 시동생, 시누이... 김치, 고시리 나물, 콩나물국... 진달래 꽃, 장미꽃...” 등 우리말의 인사, 사람의 호칭, 사물의 이름들을 입말로 익혀주었다.
다행이 형수님의 습득 능력은 나를 놀라게 하였고 또한 배움을 즐거워 하였기에 하나를 배우시면 하나를 익히였다. 형수와 나는 저녁마다 집안일을 끝내시고 나서 밥상에 마주하고 앉아 중국말로 사물의 이름을 적으면 형님은 괄호를 치고 중국어발음으로 적어주었다. 이 종이 장은 형수의 무기었다.
이튿날 노동을 하다. 쉴 틈만 있으면 종이 장을 꺼내들고 아줌마들에게 묻고 하면서 이름들을 외우셨다. 나도 틈나는 대로 초등학교 국어책을 많이 형수님에게 읽어주면서 많은 대화를 하였다. 반년이 지나자 형수는 우리말에 대한 내공이 조금씩 쌓여 일과 생활에서 우리말로 막힘없이 대화를 할 수 있었다.
형수는 나를 친동생처럼 사랑하였다. 어머니 모르게 십전, 이십전 나의 호주머니에 넣어주었다. 그 시절 이십 전은 큰돈이었다. 대사집에 갔다가도 찰떡, 절편 등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오셔서 나의 손에 들려주었다. 어머니는 형수에게 김치, 된장, 국수, 떡, 묵... 등 만드는 조선음식법을 가르쳐 주셨고 여인으로 갖추어야 할 도리를 알려 드렀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께서 저녁에 술 한잔 드시고 “심청전”, “춘향전”을 구수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렇게 일 년이 지나 저녁마다 밥상을 놓고 우리말 자모(자음), 이름(명칭)을 가르쳤다. 음가를 익히고 우리말 모양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형수에게 큰 도전이었다. 자음 19개, 모음 21개, 받침 27개 우리말의 자모를 익힐 때 나는 형수에게 쓰기보다는 발음을 먼저 익혔다. 낱자와 해당하는 소리를 먼저 익히고 후에 필순에 따라 낱자를 따라 쓰기 연습을 하였다.
모음 “ㅇ”와의 결합을 통하여 음절의 구성을 설명하였다. “ㅏ”는 이것만으로 한 음절 글자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그 자리에 “ㅇ”를 쓰고 “아, 야, 어, 여, 오, 요”, “ㅏ, ㅑ, ㅓ, ㅕ, ㅗ, ㅛ...”와 발음이 같다고 형수는 천천히 한 자음, 한 모음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자모를 읽기 시작하였다. 여동생도 따라 읽었고 손 바늘 질 하는 어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였다.
형수님이 자모를 떼고 나서 나는 단어 만들기를 가르쳐 주었다. “ㄴ+ㅏ=나,ㅁ+ㅜ=무, 나무” 그리고 1학년 교재를 들고 따라 읽기 하였다. 우리말을 읽고 쓰는 것이 조금은 서툰 형수지만 끈질지게 노력하는 보람으로 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형수는 “요녕조선문보”를 구독할 수 있었고 조선족으로 환골탈태하였다.
1971년 현성조선족중학교가 폐교되어 나는 동네와 15리 떨어져 있는 한족중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되었다. 그 시절은 가가호호 추수기 전이라 집에 쌀이 거의 떨어져 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나의 집도 8월이면 시래기 밥, 옥수수밥으로 끼니마다 배를 채웠다. 그러나 형수는 아침밥을 밥그릇에 담을 때 먼저 시래기를 한쪽으로 밀어 놓고 나의 도시락에 쌀밥만 담고는 시래기와 쌀밥을 섞어 식구들의 밥그릇에 담았다. 형수 덕분에 점심한때는 하얀 쌀밥이 나의 뱃속으로 한 숟가락씩 들어갔다.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그해부터 형수는 쉬는 날 산길을 걸어 다니면서 약 뿌리를 캤다. 아 름드리 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살림 속에서 또는 등 넝쿨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곳에서 약 뿌리 캐서 집에서 말려서는 약재상점에 팔아서 신문잡지를 주문하였다. 덕분에 나는 책을 읽었고 필을 들었다. 나는 언제나 글을 쓰고 형수에게 수정을 받고나서 재 다시 원고지에 옮겨 썼 다. 형수는 나의 교정선생이 되었다. 형수의 도움으로 수필, 단편소설, 실화 등 글을 신문잡지에 실렸고 수차례 문학상을 받았다. 18년 형수와 한 지붕에서 살다가 결혼하여 벌방 중학교로 전근되었다.
나는 20년간 형수를 뵙지 못하였지만 어머니가 계신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여 이국땅에서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가 사라지면 존경스러운 형수님을 모시고 중국의 이름난 명승지들을 찾아다니면서 형수님을 구경시키고 싶다. 조금만이라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다.
/신석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