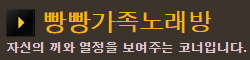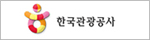까치 둥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14 23:25 조회320회 댓글0건본문
오늘 아침에도 까치 소리를 듣고 푸르름이 가득한 나무들을 보며 눈을 정화시켜 본다. 까치는 사람들이 집을 없애버려도 원래 있었던 곳에다 다시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새들이 부러진 가지로 집을 지으라고 봄에 꽃샘바람이 분다는 것도, 알이나 새끼가 떨어져 다치지 말라고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는 것도 최근에 검색창에서 우연히 알게 되였다.
이른 봄, 병원의 뒷울안 은행나무에 까치 한 쌍이 왔다. 벌써 몇 시간째 나무에서 놀고 있다. 예로부터 까치의 울음을 길조라 해서였던지 나는 소시적부터 까치를 많이 좋아했다. 어릴적 외롭게 자란 나는 이웃집에 친척이 오는 것도 부러웠고 설 명절 친구 집에 삼촌, 고모들이 오는 것도 부러웠다. 까치가 우는 아침이면 멀리 계신 친척의 편지라도 받을 수 있나 하고 종일 우체국 아저씨를 기다리기도 했다. 사실 큰아버지나 이모들 모두 외국에서 살다 보니 일년 내내 기껏해야 편지나 주고받을 뿐이였다. 기쁜 소식 전한다는 까치소리는 언제나 귀 맛 좋았다. 그렇게 천진하고 유치하면서도 막연한 그리움과 바램속에서 나의 동년이 흘러갔다.
지금도 까치소리를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고 무언가를 기다리게 된다. 그런 까치가 눈앞에서 놀고 있으니 어찌 반갑지 않으랴! 나는 배시시 웃으며 창가에 붙어서서 놀고 있는 까치 한 쌍을 바라보고 있었다. 병실 창으로 보이는 은행나무에 아마도 까치가 둥지를 틀 모양이다. 사람이 집터를 고르듯이 며칠 나무에서 오르락내리락 이리저리 옮겨가며 분주하다. 이가지 저 가지로 퐁퐁 뛰기도 하고 포르룩 포르륵 날기도 하면서 아름드리 은행나무 주위를 맴돌며 기분 좋게 깍~ 깍 울어댄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가에서 까치를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한 요즘이다.
까치의 집짓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듯하다. 이른 새벽부터 한 마리가 나무위에 앉아 있고 다른 한 마리는 밑에서 나뭇가지를 부리로 쪼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다 가지를 물고 나무 위로 날아오른다. 그 다음은 나무 위에 있던 다른 한 마리가 내려와서 똑같은 행동을 하더니 가지 하나를 물고 날아오른다. 부지런히 오르내리는 그 모습이 애처롭기도 하다.
포르륵 어딘가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날아가더니 올 때는 자기 몸집보다 큰 나뭇가지를 물고 이리저리 옮겨가며 둥지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 열심히 나무 가지를 물고 나는 까치 모습이 대견스럽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까치의 집짓기는 멈출 줄 모른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해질 때까지 평소보다 많이 창가에 다가가서 까치들을 바라보았다. 그러기를 40여일뒤 둥지는 제법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까치는 꽤 바삐 움직이더니 뭐가 급했는지 둥지가 완성되기 전에 입주했다. 산란기를 앞두고 '내 집 마련'에 열을 올린 모양이다.
까치 집이 지여진 은행나무는 5층 병실창에서 잡힐 듯 붙어있어 창을 열면 나무와 둥지가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가 걸려 있는 듯하다. 봄이 가고 은행나무에 초록이 짙어지어 나무잎새 푸르름이 생명의 기운을 뿜어냈다. 살랑살랑 봄바람을 받아내는 까치집의 흔들림도 좋았다. 부화기에 암놈은 알을 품고 있고 숫 놈이 먹이를 날라다 먹인다고 하더니 까치가 부화 중인지는 알 수 없다만 한 마리만 새벽부터 깍깍하며 드나든다.
누가 봐도 평온하고 햇살 다붓한 아침이다. 까치 소리가 갑자기 우악스럽게 부산스러웠고 밖에서 소란스러운 기계 소리가 들렸다. 어질러진 뒤 뜰에 깜짝 놀랐다. 사다리차에 톱들고 웬 아저씨가 나무를 베고 있었다. 병원 뒤 울안에 열을 지어 서 있는 은행나무 몇 그루가 모두 잘려나갈 판이다. “큰일 일이다. 까치 집을 어떻게 하면 좋아?” 환자들도, 간병인들도, 모두 유리창을 두드리며 항의했다. 한참 서성대며 황당해하는 우리에게 “병원장이 나무숲이 병실을 가려 자르라 했다.”며 아저씨는 병원장을 원망하라는 식으로 태연하다.
아저씨의 사정없는 손놀림에 따라 우람한 은행나무가 싹둑싹둑 잘려나가고 아침까지 드나들었을 까치의 보금자리도 “우지직” 하는 힘없는 비명을 남기고 바닥으로 곤두박질한다. 까치집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모두 피했다. 까치집이 내동댕이쳐졌다. 불과 몇 초 사이에 산산조각이 났다. 잘린 등걸과 흩어진 잔가지며 잎들을 뒷정리하고 있는 아저씨를 보며 부리에 피가 나도록 집 짓느라 바둥거리는 날짐승의 집을 가차 없이 허물고도 어찌 저리 태연할까 싶었다. 일당을 버는 밥벌이라 할지라도 미안함이 조금은 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 아저씨 속내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며 혼자 안달 낼 수밖에, 나는 짠한 마음을 쓸어 안았다.
십 수년 자란 은행나무는 동강난 앉은 뱅이가 되여 5층 병실 창에 붙어선 나를 쳐다본다. 5층 집 높이보다 더 자란 나무를 밑동만 남겨놓은 건 모를 일이었다. 너무 안타깝고 애석하여 병원장에 따져 물었더니 ”은행나무가 병실 시야를 가려서 어쩔 수 없었다“며 옹색하게 둘러댄다.
베려면 까치가 집짓기 전에나 베였어도 이다지는 기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한자리하면 뭐든 다 해낼 수 있는 양 설쳐대는 힘을 거머쥔 사람의 어설픔이 병원까지 난무하는 세상이다. 저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득과 실만 따지고 날짐승의 생존과 자연의 생태보전에는 배려가 일도 없다. 감나무의 홍시를 다 따지 않고 까치밥이라며 남겨주었던 우리 조상들이 아니던가? 길고 깊은 줄 알았던 인간의 정분이란 게 이렇게 쉬이 앵돌아질 줄이야. 세상민심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
내 집이 없어졌다고 세상에 알리는 듯 깍~깍 소리는 구슬펐다. 알을 낳았는지 품었는지 새끼는 어찌 됐는지 알 수 없는 까치의 울음소리는 그 후에도 여전히 슬프게 울렸다. 얼마나 애가 탈까? 둥지가 사라진 허공을 돌며 며칠이나 까악~ 까악~, 슬픔과 원망 같은 것을 처량하게 하소연하더니 어딘가 날아갔다. 그리고 천둥소리와 몇 번의 소낙비 소리, 세상을 어지럽힌 장마 비까지 지나 몇 달이 흘렀다.
어느 날 이른 새벽부터 찾아와 옥상에 뿌려주는 먹이를 찾고 있는 까치 한 쌍의 깍, 까아깍 소리가 귀맛 좋게 들린다.
“집 잃었던 그 녀석들이 돌아온건가?”
“세상에나 너네가 또 왔니? 뭐가 아쉬워서?”
집 잃은 까치가 어이 상실하여 어디에 가 기절한 줄 알았더니 까치는 옛터를 못 잊어 몇 달 만에 또 나타나서 깍깍 울어댄다. 그동안 어디 가서 새집을 짓고 살았던 건지, 아니면 집 짓는 철이 지나서 어느 빈집에서 임시 서식지를 정한 건지, 아무튼 까치는 처량한 울음소리를 남기고 떠났다 다시 돌아왔다. 아침마다 시끄러울 정도로 까치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환자들에게 친숙했던 까치, 먹이까지 챙겨주며 반겼던 까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던 까치가 다시 돌아왔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왔다고 즐거워하던 꼬마들마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벽 치며 좋아하신다. 반갑다 까치야! 그리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개구리소리 들을 수 없듯이 까치의 울음 소리마저 이 땅에서 사라질까 우려스럽다. 그 어딘가 안전한 곳에 둥지를 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기원한다. 생태계 보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김선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