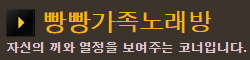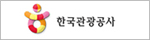사과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3-04-27 22:04 조회710회 댓글0건본문
건들 들린 파아란 하늘에 한입 베어 먹고 싶을 만큼 예쁜 분홍색 솜사탕 같은 구름이 드문드문 떠 있고 들에는 풍성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바람에 출렁거린다.
터밭에는 대궁까지 주렁주렁 달린 고추가 따가운 해 볕에 익어 숯불처럼 이글거리고 그 옆에 시샘이 날 대로 난 방울토마토가 하루 밤 사이 토끼 눈이 됐다. 마당 한 구석에는 가지가 휘게 대롱대롱 달린 주먹만 한 사과가 초롱불을 밝히고 연록의 짙은 잎들이 가을바람에 서걱서걱 소리를 내며 가을의 진수를 보여준다.
너무도 풍요롭고 평온한 풍경이어서 눈으로 보기에 마음으로 가까이하기에 가슴이 벅차고 내 마음까지 풍요롭다. 하지만 가을이 되여 빨갛게 익은 사과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저도 모르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 그 가을에 있었던 옛 추억이 사금파리처럼 이따금 세월의 구름 사이로, 기억이라는 해살이 내리 쬘 때마다 새록새록 되살아 나군 한다.
나의 어린 시절은 전국적으로 자연재해가 연속 3년 동안 지속되어 집집마다 들나물과 산나물, 감자와 호박, 배추 잎이나 무 잎을 대식품으로 식량을 보태며 허기진 배를 겨우겨우 달래며 목숨을 연명해가던 시기였다. 그런 세월에 어머니는 봄이면 손바닥만 한 앞 뒤뜰과 논밭머리의 소 엉덩짝만한 자리에도 자류지를 일구어 감자나 호박, 풋옥수수를 깨알처럼 박아 심었다.
터 밭의 고추가 빨갛게 익어갈 무렵이면 어머니는 호미를 들고 자류지로 나가 햇감자와 호박, 풋 옥수수를 뜯으러 가는데 그때면 나와 형님은 무작정 어머니의 뒤를 따라 나선다.
어머니는 자류지의 김을 매느라 여념이 없고 나와 형님은 메뚜기 잡기에 정신이 없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기울면 이때 메뚜기 잡기에 황금의 적기이다. 낮에는 스치기만 해도 콩 튀듯 튀던 메뚜기들이 해거름이면 한 마리씩 둘러 없어 굼뜨다.
그때면 형님이 감자 잎이나 호박잎에 앉은 메뚜기를 움켜잡으면 나는 강아지풀 대궁에 꿴다. 한 대궁이 차면 또 한 대궁, 그사이 어머니는 저녁거리로 감자나 호박 풋옥수수를 따서는 메뚜기 잡이에 정신이 없는 우리 형제를 불러 집으로 향한다.
어머니는 서둘러 밖에다 내건 솥에다 감자와 호박, 풋옥수수를 안치고 우리 형제를 불을 때게 한다. 그때면 나와 형님은 들판에서 잡은 메뚜기를 구워 먹는데 입과 얼굴에는 검댕이투성이다. 그래도 메뚜기도 고기라고 그때 그 메뚜기가 그렇게 맛있던지 나이 60이 다 되는 지금도 메뚜기를 보면 저도 모르게 입안에 군침이 돈다.
여덟 살쯤 가을의 어느 일요일로 기억된다. 그날 어머니는 우리 집과 5리 떨어져 사는 외할머니 집으로 김장배추를 솎으러 간다고 하기에 나도 따라 나섰다. 왜냐하면 외할머니 집 뒤뜰에는 큰 사과나무 세 그루가 있었는데 해마다 가을철이면 빨갛게 익은 사과들이 가지가 휘게 주렁주렁 달렸다. 평시 나는 사과를 먹고 싶었지만 외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옆에 공동묘지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 대낮에도 구멍이 뚫린 묘지에서 여우 귀신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겁이 많은 나는 나 혼자서 외할머니 집으로 갈 엄두도 못했다.
어쩌다가 외할머니가 우리 집으로 내려오거나 어머니가 외할머니 집으로 다녀올 때면 사과를 한 광주리씩 따 가지고 왔는데 우리 8남매가 그 한 광주리 사과를 잠깐 사이에 다 먹어 버려 굽이 난다.
그래서 가을철이 되여 어머니가 외할머니 집으로 갈 때면 나는 무조건 따라가서 사과를 배부르게 먹고 또 할머니가 보자기에 따 놓은 사과까지 들고 온다.
그날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공동묘지를 벗어나기 바쁘게 멀리서부터 마을 어귀에 있는 외할머니 집이 보이자 한달음에 달려가 외할머니께 인사를 하거나 말거나 뒤뜰부터 들어가 사과를 따 먹기에 급했다.
한참 따 먹고 나니 배가 떵떵 불렀고 가지고 간 광주리에 넘쳐나게 사과를 뜯어 담았고 내 주머니마다 사과가 찼으며 내 두 손에도 사과를 가득 움켜 쥐였다. 그런데도 손에는 꽉 찾어도 마음에는 차지 않았다.
더도 말고 내 키보다 조금 높은 곳에 유난히 빨갛게 익은 사과 몇 개가 먹음직스러워 그 사과 몇 개만 더 따려고 까치발을 하고 가까스로 그 사과를 따는 순간 손에 있던 다른 사과들이 빠져나갔다. 따면 빠져나가고 그러기를 반복하는 동안 약이 올랐다.
바로 그때 "그만하면 됐다."는 어머니의 목소라가 들려왔다. 어머니가 어느새 김장배추를 다 솎고 마당에 나와 계셨다. 나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오는 길에서 어머니는 나에게 어린놈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 장차 좋은 사람이 되기 어려우니 절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후 우리 8남매에게도 항상 그 말씀하면서 교육했다.
비록 여덟 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 후로부터 나는 어머니의 "그만하면 됐다."는 그 한마디 말씀과 사람이 욕심을 너무 부리면 좋은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았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은 언제나 내 삶의 거름이 되고 둘도 없는 지침으로 되여 남의 손에 쥐인 큰 떡보다도 내 작은 손안의 작은 떡에 만족을 했고 내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서 거창한 행복을 찾은 것이 아니라 깨진 유리 조각 줍듯 내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주었으며 세계를 통치하려는 히틀러의 거창한 꿈보다 시골의 들길에 뒹구는 한 방울의 이슬에서 내 소박한 꿈을 이루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다.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며 보람을 느낀다.
그때로부터 어언 반세기가 지났고 어머니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내 나이도 어느덧 60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지금도 해마다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익은 사과나무를 바라볼 때면 그 제날 나에게 한 어머니의 말씀이 환청처럼 들리며 작은 내 손은 생각지 않고 욕망의 수치가 늘어날 때,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무언의 말씀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가를 나는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된다.
나는 오늘도 저무는 들녘에서 작은 폴씨로 뒹굴면서 내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기에 노력하고 있다.
내 자식들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허명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