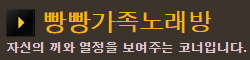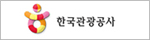‘7자 나무’와 어머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13 06:16 조회416회 댓글0건본문
내 나이 80이 다 된 지금에도 나는 고향의 마을밖에 있는 ‘7자 나무’를 생각하면 어린 시절의 일이 생각난다. 딩시, 아침 일찍 연길시장에 쌀 팔러 가는 어머니를 배웅하고 오후에 돌아오는 어머니를 마중하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영화의 화면처럼 내 눈앞에 안겨온다.
그 때 우리 집은 연길현 태양구 중흥촌 7대(지금의 연길시 조양천진 중평촌 7대)에서 살았다. 마을 동쪽에는 연길에서 삼도만으로 통하는 도로가 있었는데 우리 마을에서 2리쯤 잘 되는 도로 옆 광석촌과 중흥촌 경계에 성인의 한 아름 거의 되는 비술나무 고목이 한그루 있었다. 그 나무가 7자 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사람들은 지금까지 ‘7자 나무’라 부르고 있다. 현재 ‘년세’가 200세를 훨씬 넘것 같다.
지금 길옆 웅덩이에 서 있는 ‘7자 나무’에는 숱한 붉은 천들이 얼기설기 감싸여 지방의 보물로 모셔지고 있다. 두 세기를 살아오는 이 ‘7자 나무’는 험난한 세월의 풍상고초를 겪으며 무수한 사람들과 함께 세세 대대로 뜻깊은 추억을 남기고 있다.
동년 시절의 우리 가정은 생활이 너무도 가난하고 처절하였다. 내가 일곱 살에 중병에 걸린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우리 가정은 어머니 한 몸으로 늙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우리 3형제들을 거느려야 했다. 아버지가 사망 될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벌써 70을 바라보는 년세였고 큰형님이 10여 살로 모두 코흘리개 아이들이였다.
농사군 가정인 우리 집은 유일한 일군이였던 연약한 어머니가 밭갈이로부터 파종,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남의 집 소차를 빌려 쓰며 해방을 받아 분배받은 한 쌍 남짓한 벼농사를 매일 새벽 별을 이고 나가서는 달을 이고 돌아오며 힘들게 지어왔다. 농사군 남정네들도 하기 힘든 논갈이를 30대의 어머니가 하였으니 그 고생이야말로 하늘땅이 맞붙을 지경이였다. 그래도 다행히 농사는 고마운 이웃들의 도움으로 그럭저럭 괜찮게 지어왔다.
농사의 모든 환절이 모두 바빴으나 그중에서도 제일 힘들었던 것은 겨우내 지어놓은 벼농사를 처리하는 것이였다. 1950년 좌우 우리나라는 호도거리 농사를 지었는데 국가의 공량 임무를 완성한 나머지 벼는 모두 쌀로 찧어 연길시장에 가서 팔아 돈을 만들어 가정의 일상 생활용품들을 샀다. 당시 태양구에는 농부산품 교역시장이 없어 중흥촌 일대의 농민들은 모두 연길시장으로 쌀 팔러 다녔다. 연길시장은 우리 마을에서 30리 상거한 곳이다.
소수레가 있는 집들에서는 량식 등 농부산품을 수레에 싣고 사람까지 앉아서 쉽게 다녔지만 소수레가 없는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50~60근 되는 입쌀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30리 길을 걸어서 연길시장에 팔러 나갔다. 아마도 1년에 10여차는 잘 되였을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어린 섬약한 힘으로나마 어머니를 도와 나섰다.
1948년 여름에 있은 일이다. 아침 일찍 나는 제딴에는 남자라고 10여근 되는 쌀을 등에 메고 앞장섰다. 어머니는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된다”고 말렸지만 나는 듣지 않고 ‘7자 나무’ 있는 데까지만 메고 가겠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앞서 걸었다. 그런데 웬걸 쉽지 않았다.
‘7자 나무’는 2리쯤 되는 곳에 있는데 2리도 채 오기 전에 10여근 쌀이 천근 무게로 지지누르며 걷기조차 힘들었다. 그래도 나는 땀을 흘리며 젖먹던 힘까지 다 내여 ‘7자 나무’가 있는 곳에까지 메고 갔다. ‘7자 나무’ 밑에서 어머니는 땀벌창이 되여 헐떡거리는 나의 등에서 쌀 짐을 내리고는 어머니의 쌀 짐과 합하였다. 그리곤 어머니는 그 무거운 쌀 짐을 이고 지고 종주먹을 쥐고 걸음을 재촉하였다. 어머니의 뒤 모습을 지켜만 보며 더는 도와주지 못하는 내가 너무 한스러워 말못할 울분과 설음에 북받쳐 저도 모르게 ‘7자 나무’를 부둥켜안고 통곡하였다.
어머니는 ‘7자 나무’에 굳어져 있는 나를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손짓하였다. 잠자코 있던 ‘7자 나무’도 어서 어머니 말씀을 들으라는 듯이 고개를 흔들 흔들 하기도 했다.
오후 2시 쯤 되면 나는 또 ‘7자 나무’까지 어머니 마중을 갔다. 어머니가 오는 양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아예 ‘7자 나무’위에 올라가 가로 타고 앉았다. 마치 키 큰 아버지의 목마를 탄 것 같았다.
‘7자 나무’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나의 마음은 더없이 초조하고 애절하였다. 이후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다. 어머니는 양손에 깁고 기운 새하얀 헌 코고무신을 한 짝씩 거머쥐고 맨발 바람으로 맥없이 걸어오고 있었다. 다른 집들에서는 언녕 버렸을 헌 코고무신도 어머니는 아까와서 신지 않는 것이였다.
나는 그 높은 7자 나무에서 단숨에 뛰여내려 “어머니!” 하고 소리치며 달려가 어머니 품에 안겼다. 어머니는 내가 얼마나 기특했던지 빙그레 웃으시며 나의 어깨를 살며시 도닥여주셨다. 그리곤 인차 치마 말기에 감쌌던 개눈깔사탕 두 알을 꺼내여 한 알은 내 입에 넣어주고 한 알은 내 손에 쥐여주었다. 달디단 사탕 물이 나의 목구멍을 적실 때 초들 초들 말라 터진 어머니의 입술에는 피 빛이 력력했다.
보아하니 어머니는 오늘도 또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아끼시느라 점심도 사 잡숫지 않은 것이 분명하였다. 나는 재빨리 개눈깔사탕 한 알을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다. 어머니는 “너 먹으라 고 준 건데…” 하면서 입안에 사탕을 다시 꺼내려 하였다. 나는 날랜 솜씨로 어머니 입을 꼭 막고 놓지 않았다. 어머니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보는 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눈물을 흘리시며 “너도 인제 헴이 다 들었구나?” 하시면서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셨다. 나도 뜨거운 그 무엇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을 감촉하였다. 눈물이 확 솟구쳤다.
‘7자 나무’ 밑에서 어머니와 나는 개눈깔사탕 한 알씩 녹이며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불시로 맑았던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이 울부짖으며 심술궂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나와 어머니는 재빨리 ‘7자 나무’에 붙어서서 빈 쌀자루를 하나씩 뒤집어썼다.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나를 감싸 안으며 쏟아지는 비를 막았다. 억수로 내리는 비였지만 다행히도 ‘7자 나무’의 덕택에 우리는 물 참봉은 면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베적삼은 다 젖었다.
좀 있더니 하늘은 내가 언제 심술을 부렸냐는 듯이 쾌청한 날씨에 불볕을 쏟기 시작하였다. 비에 젖어 붙은 6승 베천 너머로 어머니의 여윈 등 곬이 가냘프게 보였다. 37세에 청상과부로 된 나의 어머니는 가정을 위하여, 세 자식을 위해 재가의 좋은 기회도 모두 뿌리치고 자기 한 몸을 희생한 것이다.
나는 여덟 살 되는 그해에 어머니를 도와 봄부터 가을까지 10여차례 쌀을 메고 ‘7자 나무’ 있는 곳까지 메여다 주고 오후엔 또 어머니 마중을 다녔다. 아홉 살부터는 소학교공부를 거쳐 중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더는 이전과 같이 어머니와 동행할 수 없었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서는 어머니와의 조용한 만남이 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여덟 살 되는 해에 어머니를 도와 쌀 짐을 메고 ‘7자 나무’ 있는 곳까지 동행했던 그 나날들은 내가 세상을 알기 시작해서 어머니와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였으며 내 인생의 참맛을 알고 인생의 철리를 배운 보귀한 기회였으며 내 인생에서 가장 어머니에게 효도했던 시기라고 생각된다. 그 나날들은 내가 인생의 아리랑 열두 고개를 걷기 시작한 좋은 기회였으며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의 첫 인간수업이었다. 그리고 내가 일찍 헴이 들어 오늘까지 사람답게 살아올 수 있도록 말없이 가르쳐준 어머니의 가르침이였다.
그래서 나는 1948년 그 1년간의 어머니와의 동행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보귀한 나날들이였다고 생각한다. 그 나날을 통해 나는 행복의 진가를 똑똑히 알았고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터득하게 되였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삼 형제는 몰라보게 성장하였는데 어머니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우리 세 아들은 모두 출세하여 나라의 훌륭한 인재로 되었다.
/김삼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