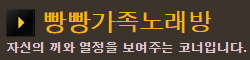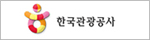잊지 못할 한국녀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4-01-06 17:29 조회372회 댓글0건본문
오늘 나는 베란다에 놓여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게 되었다. 트렁크를 열고 보니 편지봉투가 있기에 하던 일을 놓고 소파에 앉아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퇴근하면서 공장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하였지요. 일주일 전 점심시간에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임직원들의 말밥에 올랐으니 나는 어쩔 수 없어 아저씨 곁을 조용히 떠나는 것입니다. 부디 양해를 바랍니다.
아저씨는 한국분이 아니지만 우리 나라 역사와 문화를 잘 알고 또는 성실하기에 공장장과 직원들은 아저씨를 외국인이라고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아저씨 저는 5년 전 서울에서 살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자 시골 친정집으로 이사하여 버섯농장에 입사하였어요. 버섯농장에서 고독하게 지내다 아저씨가 입사한 그 날부터 더 이상 불행한 여인이 아니었지요.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진 삶 중에서 아저씨는 목마를 때의 단비처럼 어두운 동굴의 한점 빛처럼 소중한 분이였어요. 아저씨와 10개월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간 정이 들었지만 “사랑합니다.”란 말을 하지 못하였어요.
나는 진심으로 아저씨를 사랑했어요. 너무도 사랑했기에 아저씨의 옆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나는 아저씨와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다른 여인에게 불행을 주고 싶지 않았지요. 아저씨는 사랑하는 여인과 귀여운 자식을 두고 헐헐 단신 이국땅에서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 귀국하여 제대로 살겠다는 아저씨의 행복한 가족을 나 때문에 산산조각 내고 싶지 않았어요. 아저씨도 마음속으로 저를 아끼고 좋아하였지만 한 번도 저에게 정을 주지 않았지요. 만약 아저씨께서 저와 사랑을 나누자고 하였다면 따라나서겠지요.
아저씨, 사랑해요. 한 번 더 불러보는 이 못난 여인을 양해하세요. 나는 이따금 일을 하다 쉴 참에 아저씨의 넓은 어깨에 지친 가슴을 기대고 싶었어요.
아저씨, 하고 싶은 말을 어찌 이 종이에 다 적을 수 있겠나요. 부디 건강하십시요.
안녕히!
2007년 11월 8일
영실(올림)
나는 편지를 단숨에 읽고 나니 마음이 허전하여 눈을 감았다. 지나온 날들의 기억이 엉켜들었다. 그러나 굳이 피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 기억들은 비록 괴로움에 있을지라도 오래 동안 내 마음에 그녀가 남아 있었고 그 추억만 떠오르면 연민으로 지금도 얼굴이 달아 오른다.
16년 전 일이다. 자녀들을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기 위하여 20년 사업하던 교직에서 벗어나 한국행을 결심하였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노가다 일을 해야 하는 두려운 마음을 애써 추스르며 한국에 입국하여 백두대간의 남쪽 끝 지리산에서 북으로 2Km 떨어진 식송마을 버섯농장에 입사하였다. 그곳은 문만 열면 병풍을 펼쳐 놓은 듯 산으로 감싸여 있고 3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시골마을이였다.
버섯농장에 공장장 한 분이 남자고 50대 반 녀인들이였다. 잡초 속에 한 떨기 꽃이라면 마흔 살 영실이란 이쁜 녀인이 나에게 서슴없이 웃어주면서 나의 고독한 마음을 편안하게 녹여주는 보기만 해도 따뜻한 녀인이였다.
공장장은 첫날부터 버섯가공실로 안내하고는 기계 다루는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그때만 하여도 기억력이. 좋아 초보자이지만 열흘이 지나 기계를 숙련하게 다루게 되었다. 공장장은 30명 임직원 중에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는지 영실씨를 나와 함께 일하게 작업실로 보내어 나로 하여금 젊은 녀인과 일을 하게 되어 힘든 줄 모르고 영실씨와 호흡이 맞아 하루 일감을 일찍 끝내고는 아주머니들의 일손을 도와주니 2개월이 지나자 월급이 10만원 오르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점심 한 끼 먹을 수 있으니 아침저녁 숙소에서 밥은 지어먹어야 했다. 영실씨는 아침마다 손수 만든 반찬을 도시락에 담아 가지고 와서는 나의 숙소에 두고 공장문에 들어서는 것이 일쑤였다. 나는 영실씨 덕분에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고독의 밤이 찾아올 때면 두 눈에 눈물이 글썽이곤 했다. 가족과 리별 아닌 리별을 하며 남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밤마다 가장 강한 욕망을 어떤 것일가? 끝없이 타오르는 육신의 욕망이 아닐까? 그 욕망을 제때에 해결할 수 없어 불행을 느끼는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남자의 구실이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자문하기도 했다. 자작나무 잎도 밤에는 두 잎이 서로 붙어 잠을 잔다는데 어찌 인간이 혼자 긴긴밤을 혼자 지낼 수 있으랴. 그러나 나는 참고 버티면서 애꿎은 백열등만 껐다가 켜고 누워 뒤척이기를 수차례 그러다 잠이 들군 하였다.
길몽도 너무 길면 혼란스러워지고 기쁨도 잦으면 다가올 재액이 온다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점심시간이 되어 기계를 멈추고 청소하던 중 눈에 티가 들어가 눈을 비빌수록 더욱 아파 났다.
이때 감바기 《아저씨, 눈을 비비지 마세요 비빌수록 티가 안구에 박혀버리면 빼내기가 힘들어 져요. 잠간만 기다리세요.》
영실씨는 촉촉한 티슈를 돌돌 말아 뽀족하게 만든 다음 나의 눈 가풀을 젖히고 눈 속의 티를 살짝 건드려 티가 티슈에 달라붙게 하여 빼내고는 발뒤축을 들고 나의 눈에 대고 후-후 하며 불어주고 있을 때 작업실 문이 살짝 열리면서 《식사들 하세요.》 반장 아주머니가 불쑥 들어서는 겻이였다. 나와 영실이는 피할 새가 없었다.
《자네들 부끄럽지 않는가? 작업실에서 ...》 우리가 해명할 새도 없이 반장 아주머니는 문을 쾅 닫고 나가서는 식사하는 직원들께 나와 영실씨가 작업실에서 꼬옥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었다고 살을 붙어가면서 《포》를 쏘았다. 그러자 시골 아주머니들은 신기한 일이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순간 벌어진 일에 영실이는 원통한 나머지 쭈그리고 앉아 얼굴을 감싸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올려놓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영실씨의 숨죽인 울음소리가 가느다랗게 들썩이던 어깨가 내 손을 잡아끌었을 뿐이었다. 나는 영실씨의 손을 꼬옥 쥔 채 놓지 않았다. 순간 오른손에서 아쩔한 통증이 짜르르 전해져 왔다. 영실씨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영실씨의 눈길이 내 몸을 뚫고 지나가 허공을 날았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애절함이 촉촉한 눈가에 묻혀 있었다.
나는 안쓰럽고 미안하고 딱히 무어라고 하였으면 좋을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영실씨.》
나는 그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막상 불러놓고 보니 전혀 생소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오래고 먼 옛날부터 불러온 이름처럼 따뜻한 친숙감으로 마음이 감겨들었다.
나는 손을 뻗어 영실씨를 일으켰다. 그리고 조용히 감싸 안았다. 영실이는 힘없이 무너졌다. 내 품에 안긴 영실씨는 의식을 잃고 죽어가는 여린 새 같았다. 나는 어린 새를 보호하는 어미 새처럼 영실씨의 등을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보드라운 깃털을 쓰다듬듯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눈물을 훔친 영실씨는 냉정을 찾았다. 나도 영실씨의 어깨에서 손을 거두었다. 영실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끔해져 있었다. 눈썹에 맺힌 눈물방울만이 영실씨가 울고 있었다는 것을 가까스로 기억하게 할 뿐이었다. 그나마 남아 있던 눈물방울조차 영실씨는 팔 소매부리로 단숨에 지워 버렀다.
《아저씨, 식사하러 갑시다.》
영실씨는 슬쩍 나를 보더니 작업실 문을 열고 식당으로 발길을 옮기였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 소리에 나는 깊은 사색에서 깨여났다.
아아, 인생사 헤어짐이야 다반사이지만 영실이와 이런 결별을 결구 나의 가슴에 영영 잊혀지지 못하는 추억과 또 아픔이 되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산지도 벌써 16년이 지나 두 자녀 아버지로 한 여자의 시아비로 손자들의 할아버지로 작금의 시간들 속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잊을 수 없는 한국녀인, 다시 영영 만날 수 없는 영실씨, 다만 새 가족을 이루고 행복하기를 기도하였다.
/신석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