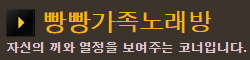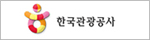아내의 편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3-11-10 15:15 조회395회 댓글0건본문
오늘 아침 나는 책상서랍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 서랍에는 30년에 걸쳐 받은 편지들을 모은 것이었다. 이 서랍속의 편지들은 정말 큰 보물이다. 옛 기억을 소환해주는 비디오테이프와도 같으니까 말이다.
나는 30년 전 아내가 나에게 쓴 두툼한 편지봉투를 들고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설레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고 그 속에서 꾹꾹 눌러 담은 진실을 느낄 수 있었다.
애 아버지, 새해 안녕하세요. 아이들도 잘 놀겠지요.
어제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더니 오늘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군요. 날씨가 을씨년스러워 손님이 찾아 들지 않아 식당 문을 닫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자니 집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필을 들게 되였어요.
애 아버지, 그날 제가 당신께 말도 없이 글쪽지만 남기고 고향을 떠나 버스를 타고 심양에 들어서니 오후 3시였어요.
넓은 대합실문어귀에는 사면팔방에서 모여든 손님들로 붐볐지요. 처음 도회지에 온 저는 어리둥절하였지만 순희가 써준 주소대로 심양역전에서 공공버스를 타고 저녁때가 되어서야 서탑에서 내렸어요. 저는 하는 수없이 서탑 부근에서 조선족할머님이 경영하는 여관을 찾아 하룻밤을 뜬눈으로 보내고는 이튿날 새벽에 ‘서탑 노무시장’에 나섰지요.
‘서탑 노무시장’은 말 그대로 여인시장이였어요. 한 켠으로 식당, 점포들이 줄느런히 늘어섰고 넓지 않은 광장에는 아낙네, 색시, 처녀들이 200여명이나 모여 있었지요. 그것도 모두 우리 산골 조선족 여인들이였어요. 길림에서 온 아낙네, 환인에서 온 색시, 신빈, 관전, 연변에서 온 처녀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인들은 그녀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따금씩 밥점 사장들이 와서는 상품을 흥정하는 것처럼 여인들과 품값을 흥정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키가 크고 날씬하고 한창 피어나는 꽃봉오리 같은 처녀들은 밥점 경리들을 따라 하나둘 택시를 타고 떠났지만 골 안에서 온 나 같은 여인들은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새파랗게 젊은 색시들은 초저녁 무도장에 출입하여 일자리를 찾는다고 서둘렀지요. 애 아버지, 저는 점심밥을 굶으면서 저녁때까지 시장에 서있었지만 헛수고였어요. 하는 수 없어 다시 여관에 찾아가니 마음착한 그 할머니는 더운밥과 따끈한 국을 가져다주었지만 그것도 먹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저는 제 설음에 겨우 이불깃을 잡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흘리었지요.
애 아버지, 이렇게 나는 사흘 동안 서탑 시장에 서있는 동안 서리서리 파고드는 안타깝고 외로운 생각에 입술이 바작바작 타고 가슴속에서는 타다 못해 새까맣게 재가 앉은 듯 싶었지요. 아, 여인들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상품인가요? 인생이 무엇이기에 애 아버지와 귀여운 자식들을 버리고 고향산천 등지고 이 타향 땅에서 하루 종일 서있어야 하는가요. 생각 같아서는 집으로 되돌아가고 싶었지만 애 아버지가 빚 때문에 밤마다 술과 담배로 역사 질 하는 것을 생각하니 다문 얼마라도 돈을 벌어 애아버지의 마음을 덜어주자고 행여나 하는 미련을 두고 이 노무시장에 서있었지요.
애아버지, 저녁때에야 바로 제가 일하는 밥점 사장이 어정어정 저의 앞에 오더니 저를 아래위로 찬찬히 훑어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지미, 밥점 일을 하려고 하오?’하며 묻지 않겠나요?
‘예, 밥점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지미 값은?’
‘450원 주세요. 저는 소고기도 잘 썰고 냉채도 잘 메우지요.’
‘그럼 아지미 그렇게 하지요.’
우리들의 값은 이렇게 흥정되어 저는 사장이 세를 낸 택시를 타고 밥점에 들어섰지요. 그곳엔 벌써 길림에서 온 처녀 복무원, 집안에서 온 색시가 있었지요. 밥점은 매우 정갈하였고 두리 상이 여섯 개였어요.
애 아버지, 그날 저녁부터 저는 식당일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지요. 정말 밥점일이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침 일곱 시에 일어나서는 남새와 고기들을 씻고는 소고기냉채, 오이냉채, 새우냉채, 해삼냉채, 시금치나물, 도라지냉채, 조개냉채 등 20여 가지를 메워놓고는 소내폰와 소고기를 썰고 갈비와 닭들을 토막내고나며는 열시쯤 되지요. 이때에야 우리들은 굽혔던 허리를 펴고 아침술을 들고나면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소리를 지르며 냉채를 찾는가하면 저기서 맥주를 어서 보내라고 다과빼지요. 그런가하면 얼근히 취한 남정들이 혀 꼬부라진 소리...
이렇게 손님들은 나가고 들어오면서 밤 열시쯤에 고주망태들이 물러나면 우리들은 행주로 음식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여섯 개 상들을 말끔히 닦고 설거지를 끝내고 나서야 문을 닫고는 잠자리에 들지요. 그때면 남몰래 고향생각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창백한 애아버지 얼굴이 꿈마다 나다났고 다섯 살인 딸 생각에 미칠 것만 같았어요. 더구나 집 걱정이 첩첩한 구름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침마다 새벽쪽잠에서 자리를 차고 일어나 그 찬물에 손을 대면서 쌀을 씻는 애아버지, 아궁이 앞에 쪼크리고 앉아 불을 피우는 애아버지, 동네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밤마다 부엌에서 빨래하는 애아버지, 당신의 마음인들 오죽 답답하겠어요.
애아버지, 우리들의 팔자란 이다지도 사나운가요. 10년 동안 가시덤불 많은 황야를 지났지만 갈수록 첩첩 강산이라고 왜 생활이 풀리지 않는가요.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흘러간 10년은 고통과 번민의 나날이었지요.
결혼 한지 5개월 만에 애아버지는 학문을 닦으러 2년 동안 저와 이별 속에서 지냈고 다달이 타는 쥐꼬리만 월급으로는 생활이 펴일 수 없다고 비누장사, 사과장사 나중에 뭉칫돈을 내와 인삼장을 세웠지만 빚더미에 올라앉고 말았지요. 애아버지는 너무 안타까워 태평양에 나가 ‘마구로배’를 타겠다고 나섰지만 그 길도 막히고 나서 앞길이 캄캄하다고 통가슴을 치지 않았나요. 하기에 저는 애아버지 모르게 이 밥점일에 나섰던 것이예요.
애아버지, 이 시각 곰곰이 생각하면 저의 마음은 정말 괴로워요. 애아버지가 이따금씩 동료들과 식당추렴을 하여도 바가지를 긁었고 눅거리 가치담배를 사 피워도 못살게 굴었지요. 한두 번 친구들과 마작 노는 것도 못 놀게 밤중에 찾아다니면서 성화를 부리던 여인이 아니었던가요. 이 몇 달 동안 시내 밥점에서 보노라니 부부 같기도 하고 남남 같은 남여 쌍쌍들이 저의 밥점에 찾아와서는 뭉칫돈을 써버리고 가지요. 담배는 10원 짜리이상으로 복무원들보고 사오라 하고는 몇 대도 피우지 않고는 상우에 버려둔 채 가버리는 것이 일쑤였지요.
애아버지. 애아버지도 사나이가 아닌가요! 그저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 죄인가요? 아니예요! 애아버지는 정말 진정한 사나이며 나의 둘도 없는 남편이지요. 집에 돌아가면 훌륭한 아내로 되겠어요. 정말이예요. 애아버지!
애아버지. 하고 싶은 말 태산 같지만 어찌 이 종이에 다 쓰겠나요. 상봉의 그날에 상세히 여쭈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1990년 1월 22일 아내로부터
아내의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자꾸 솟구친다. 지나온 인생의 희로애락이 진한 추억으로 가슴을 적신다. 흙으로 태어나 흙의 도리를 완수할 수 없는 현실에 아내는 희망을 품고 눈물을 퍼부으며 정성껏 가꿔보려 했지만 시대는 아내를 용남하지 않았고 아내는 어린 자식들을 두고 타향으로 품팔이로 나섰다.
나는 아내의 편지를 영원히 보관하여 가끔 꺼내어 보며 추억에 빠져 보련다.
/신석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