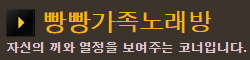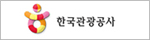[수필] 오동나무의 정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2-05-17 23:17 조회974회 댓글0건본문
도시에 살면서도 내가 항상 꿈꾸는 아파트는 옛날에 살던 고향의 집처럼 살구나무, 복숭아나무와 포도넝쿨에 에워싸인 집이였다.
손녀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여 새집을 물색하게 되였다. 마침 아파트 앞뒤에 오동나무가 우거진 집이 있어 “바로 이 집이다”’ 하고 점찍었다. 문 앞에 오동나무가 있으면 그 집에서 재상이 나온다는 말을 믿어서만 아니였다.
봄에는 나무에서 파릇파릇 돋아나는 싹을 바라보고 여름에는 무성한 나무 잎이 던져주는 그늘 밑에서 그네를 뛰고 가을에는 울긋불긋 물드는 예쁜 단풍을 볼 수 있고 겨울에는 함박눈이 듬뿍 싸인 동화와 같은 설경을 바라보면서 사계절이 분명한 자연을 애들이 읽게 할 수 있는 우리 집은 록색 아파트로 손색없다.
오월이 되면 우리 집 아파트 단지는 여러 가지 풀과 나무에 따라 독특한 풍경을 이룬다. 영춘화는 노란 금빛으로 반짝이고 장미꽃은 심홍색이거나 핑크색이고 아카시아는 흰색이고 라이라크는 보라색이다. 알록달록한 색상은 저마다 도발적이고 유혹적이다.
온갖 꽃나무들이 서로 제노라 으스대면서 가식적이고 허위적인데 오동나무만은 성격부터 다르다. 점잖게 뽐내지 않고 천천히 뒤늦게 군림한다. 계절에 대한 민감성이 약한지, 아니면 봄의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뒤늦게 꽃이 피는데 그것도 목란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깨꽃처럼 아주 작고 수수한 종모양의 꽃이 살그머니 폈다가 사그라진다.
멋스럽게 늦게 왔다가 미련 없이 먼저 떠나는 오동나무 잎도 가관이다. 한 여름이면 커다란 심장모양의 넓은 잎으로 둘레의 풀과 나무를 덮어 더위를 식혀주는, 체형이 우람지고 도고하면서 지성미를 풍기는 오동나무는 군계일학격인 품위를 보인다.
전설에 봉황은 남해에서 북해로 날아 건널 때 배가 고프면 대나무 열매만 찾아 먹고 목이 마르면 신선한 우물물만 선택하고 쉬고 싶을 땐 오동나무에 만 앉았다고 한다. 그 만큼 오동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고 오동의 자태는 웅위롭고 고귀한 품위로 눈부시단 말이다.
옛 말에 가지 없는 나무에 봉황이 깃드랴! 하는 말이 있다. 그 말은 오동나무가 귀한 나무이고 보금자리라 하지만 잘 가꾸지 않으면 제 구실을 못한다는 말이다.
부모들 마다 제자식이 룡이 되고 봉황이 될 것을 바란다. 벼농사, 채소농사, 과일농사, 글 농사 등 각종 농사 중에서 자식농사가 가장 중요한 천륜지학으로 이어지는 제일 값진 농사이다. 우리 조선족은 1900년 초부터 더 좋은 삶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와 피땀으로 허허벌판에 논밭을 개간하면서 모여든 농경민족이다. 그 간고한 시기에도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학교를 세우고 심지어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을 공부시키는 우수한 민족이였다.
어느 때부터였던지 우리 민족 중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한국으로 러시아로, 청도로 떠났다. 몇십년이 지난 오늘 살펴보니 오붓하던 민족마을이 페쇄되고 민족학교가 페쇄되고 마을에는 결혼잔치, 첫돌 잔치의 떡메소리마저 희미해졌다. 편부모 자식이거나 인위적인 “고아”가 너무 많이 생겨났다. 더 좋은 삶을 위해 떠났는데 살펴보면 행복하고 화목하고 부자 집으로 된 가정도 많지만 흐지부지 흩어진 가정도 많은 편이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고향에는 봉황이 깃들 오동나무 숲이 메말라 간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우리 민족은 지금 농경민족에서 도시민족으로 탈바꿈하는 시대에 처해있으며 거주지역도 농촌에서 도시로 전환하고 있다. 보다 부강해진 고향에서 우리 조선족이 다시 모여 공동체를 꾸려가면서 고향의 메마른 오동나무 숲을 다시 가꾸면서 오손도손 살아갈 날은 아름다운 꿈으로 환상으로 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전 지구촌이 하나로 된 글로벌 시대이다.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에 흩어진 형제들이 중국의 친인과 저녁마다 얼굴 마주하고 말할 수 있는 5G시대이다.
그러니 우리 민족이 세상의 곳곳에 흩어졌다 해도 한탄만 하지 말고 민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족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면서 기초교육의 투자에 중시한다면 고향의 오동나무 숲은 세계방방곡곡에서 무성해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 청도에 20여만 명의 조선족이 집거해 있고 상해, 소주, 등에 많은 조선족이 집거해 있는데 우리 민족 주말학교가 곳곳에 세워져 우리 민족 언어를 전수한다는 소식이 반갑기 그지없다.
농경시대의 우리 민족의 교육 얼이 살아 숨 쉰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옛날처럼 시골인 고향에 돌아와서 모여 살지 못한다고 해서 조선족사회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세계의 어디에나 흩어져 살아도 우리 민족 언어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민족 문자만 살아 숨 쉰다면 조선족사회는 가상속의 유토피아를 건설하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고향의 오동나무가 온 세상에 널리 번식하여 우리들의 봉황이 깃들고 나래 펼치길 바란다.
점잖게 멋스럽게 뒤늦게 왔다가 미련 없이 서둘러 가는 오동나무 잎을 바라보노라면 오동나무는 계절 따라 왔다가지만 인생의 꽃은 한번일 뿐 다시 피는 일이 없다는 자연의 오묘한 조화된 정념이 느껴진다.
어제 연변인 고향을 떠나 손자손녀 뒤 바라지 하려고 심양에 온지 몇 년이 된다는 50대, 60대 로 부인들과 모임이 있었다. 삼년만 애를 봐주고 돌아가려고 했던 분들이 “둘째를 낳을 수 있는 정책”에 팔구년이나 눌러앉아 있다고 했다. 고향에는 남편이 출근하는지라 혹은 다른 원인으로 로 부부들이 갈라 산지가 몇 년이 되니 불평이 없을 수 없다. 고향집에 남은 로인의 고생도 말이 아니다.
“한국에 갔더라면 벌써 50만원은 벌었겠는데 아들, 딸집에 와서 맨날 파밭을 매면서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구만!” 하는 우스개 절반 불평절반에 동감도 되긴 한다. 그러나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한 황혼육아가 힘든 것만 아니라는 결론도 나왔다.
륙십대 할머니, 할아버지로 된 우리는 제 인생만 제 인생이라고 제 멋대로 배짱을 부리지 말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룡이나 봉황이 되도록 집이란 이 오동나무 숲을 벌레 먹고 가물이 들지 않도록 잘 가꾸어서 가지가 무성하게 키우는 일에 나머지 생을 바치는 것도 점잖고 멋스럽고 미련 없는 인생의 조화된 정념이 아니겠는가를 느끼게 된다.
고향을 떠나 자식 따라 타향에 옮겨와 뒤 바라지 한지 손꼽아보니 나도 벌써 여덟 해에 들어섰다. 그러나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
후손을 재상에로 이끈다는 오동나무가 우거진 새집을 나는 너무나 사랑한다.
/황혜영 심양에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