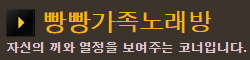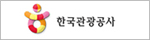늙어가는 60대는 할머니일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1-05-03 20:27 조회2,318회 댓글0건본문
장마철도 아닌데 봄비가 서럽게 내리던 날 이른 아침 시장에 갔다가 마트 앞 버스역 근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에서 내린 한 여학생이 우산도 없이 손바닥으로 비를 막으며 가는걸 보게 되였다.
학교까지 가려면 흠뻑 젖을게 뻔한데 비속으로 뛰여가는 아이가 맘에 걸렸다. 우산도 챙겨주지 않은 그 아이 엄마를 원망하면 서 나는 쓰고 있던 내 우산을 건네 주었다.
“할머니는 어쩌시려구요?” 여학생의 말이다.
나는 굳이 사양하는 여학생에게 편의점이 멀지 않으니 하나 사서 쓸 거니 걱정 말고 쓰고 가라고 떠밀었다.
할머니? 할머니라고? 그 애가 부르는 호칭에 나도 모르게 화들짝 놀랐다. 아직은 할머니라는 호칭에 익숙하지 않은 나는 기분이 묘한 정도가 아니라 충격적이였다. 손자손녀가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꽤나 있는 나이인데도 좀 서운하다.
호구부(护口本)들고 소학교에 입학하던 날 친구들과 손에 손잡고 큰길을 누비며 우린 맨날 맨날 이렇게 다니자고 약속하며 떠들고 좋아라고 했던 때가 어제 같은데 말이다.
수년간 요양병원 어르신들이 아가씨, 새댁, 애기 엄마로 불러주어서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착각하고 늙어가는 사실을 잊고 살아왔다. 아이들에게는 할머니, 성인들에게는 아주머니, 어르신들에게는 아가씨로 살아가는 60대의 삶이다.
할머니라 한다고 서운해 하는 내 모습이 우습고 한심해 보일수도 있겠지만 몸은 할머니여도 마음은 청춘이다. 마음으로는 할머니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싶다.
한국에 와서 요양병원 노인들 속에만 파묻혀 살다보니 춘절(구정)에 떡국 먹을 때만 “내가 벌써?”하며 놀란다. 어느 날 거울에 비친 내 미간과 입구에는 언제 생겼는지도 모를 천(川)자 주름과 팔(八)자 주름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맙소사, 진짜 늙었구나”하고 그때서야 늙어가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게 되였다.
아직은 늙지 않을 거라는 신념으로 외모에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는데 늙음이 이렇게도 빨리 찾아 온 현실에 아연해 졌다. 할머니에 가까워 지는 건 그토록 싫었건만 어느덧 할머니에 와있다.
늘어나는 나이 숫자 만큼이나 겉모습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도 변화를 가져 온다.
60대 전에는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갈망하면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다. 좋은 옷도 유명한 맛 집에도 명품백도 명승지 유람도 할 거라는 꿈도 많았다. 꿈만 안고, 그 꿈도 뒤로 미룬 채 살아 가기에 바빴던 60전의 삶이다.
나이 60이 넘어 환갑인지 회갑인지 지나고 나니 앞날의 꿈도 기대도 욕심도 다 사라지고 지나간 추억만 새록새록 떠오른다.
과거를 추억하는 세월이 더 행복하다. 젊음은 꿈속에 살고 노인은 추억 속에 산다는 누군가의 말이 현실로 되였다.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편한 마음 가짐으로 인생이 저물어 가는, 남의 보살핌이 절실한 노인을 돌보면서 세상에 치이며 살아가고 있다. 세월의 흐름 속에 화초 키우는 낙으로 스킨답서를 비롯한 30여개나 되는 화초를 키워 병실 안에 온통 생명력을 뿜어내는 초록으로 채웠고 그 초록들이 쑥쑥 자라는 것에 삶의 생기를 얻는다.
화분에 물을 주어 초록 잎이 싱싱해지는 것을 보면서 밀려오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기쁨에 하루하루를 보내느라 세월이 가는 줄 모른다. 항상 초록만 보고 여유를 느끼고 숫자 너머에서 오는 인생의 연륜도 무던히 스쳐 지내고 늙어가는 현실도 잊어간다.
식물과도 교감하며 사는 여유로움에 스스로 대견스러운 내가 흘러가는 세월에 늙어가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할머니로 되여 간다. 아직도 장미의 향을 품고 싶은 60대 여성의 삶은 서서히, 서서히 저물어 간다.
내 삶이 아쉽고 슬프지만, 이 또한 어이 하랴. 이것이 인생이고 삶인데 말이다.
/김선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