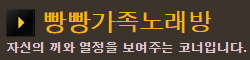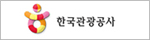글 쓰는 간병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1-05-03 20:40 조회1,503회 댓글0건본문
얼마 전에 한민족신문에서 엘리베이터 앞 복도 끝의 구석진 자리가 유일한 독서실이라는 한 조선족 간병인의 글을 보았다. 그것도 저녁 9시 이후 만이라고 한다.
언젠가 또 한 간병인이 요양병원 화장실에서 글을 쓴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도 있다. 환자들이 잠든 고요한 밤에 불빛 찾아 화장실에 가서 찢어낸 달력을 노트로 글을 써 탈고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들을 읽으면서 소박하고 강인한 간병인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지면서 마음이 짠하고 울컥해 진다. 간병인들의 이 같은 불요불굴의 정신에 나는 혼미해지고 말았다. 무한한 긍지와 자랑에 벅차다.
코로나에 일상을 송두리 채 빼앗긴 간병인에게 독서실이 어디 있고 서재가 어디 있으랴만 그래도 책 읽는 간병인이 있고 글 쓰는 간병인이 있다. 엘리베이터 앞 복도 끝에 의자 하나만 달랑 놓은 구석진 곳이, 어느 간병인의 독서실이고 찢어낸 달력장이 어느 간병인의 노트이며 나의 서재는 병원 옥상이다. 우리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여유와 공간도 없다. 가장 바닥이라고 느끼는 곳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쓴다.
내 글은 탁상 등이 켜져 있는 서재의 책상에서 써 지는게 아니라 병원옥상에 떠있는 구름송이에서 흘러내린다.
하얀 구름송이가 떠있는 파란하늘, 은행나무 가지에서 까치의 울음소리가 기분 좋게 들려오는 상쾌한 아침에는 밝은 글이 써지고 먹장구름이 뒤덮인 음침한 날에는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 분노와 억울함, 슬픔이 담긴 글이 된다. 구름 한점 없는 맑고 푸른 하늘을 보노라면 고요한 호수가에서 잠들고 싶은 그림이 펼쳐지면서 그리움과 향수에 젖어 정이 넘치는 따뜻한 글이 된다.
나는 옥상에서 글감이 잘 떠오른다. 이른 아침 옥상에서 걸으면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구상을 한다. 휴대폰으로 글귀가 떠오르는 대로 중얼중얼 녹음해 놓고 다음날 새벽 3~4시경 환자가 잠자는 새벽에 이어폰으로 전날 녹음을 들으면서 휴대폰에 글을 타자하여 정리한다.
코로나가 나를 글 쓰게 하였다. 작년 추석부터 이 옥상에서 씌여진 글이 무려 10여 편이다. 학생 때 작문을 써보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논문 몇 편을 써 본게 고작이었던 내가 코로나에 갇혀 힘든 간병일상을 보내면서 고향의 그리움과 가슴에 맺힌 한을 글로 담게 되였다.
처음 옥상에서 흘러가는 구름을 쳐다보며 추석에 부모님 성묘도 갈 수 없는 불효로 설음이 북받쳐 북녁 하늘을 우러러 “그대 이름은 간병사”라는 시도 수필도 아닌 글을 썼다.
처음 쓴 글을 함께 일하는 간병인들에게 보여주고 간병인 그룹 채팅 방에 올렸는데 간병인들이 읽으면서 눈물을 훔친다. 왜 우냐고 하니 글 속에서 자기가 보이는 것 같다고 한다. 타향살이의 아픔이 공감되여 많은 간병인들이 퍼갔고 댓글도 폭발했다. 그 이후로 아픈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코로나로 힘들게 보내는 간병인들의 삶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코로나에 갇힌 간병인의 삶”은 고향인 연변에서도 퍼가서 친구들이 고생 그만하고 빨리 귀국하라고 성화다. “무너져가는 요양병원의 일상”은 한민족신문사 전길운 사장님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추천해 주셔서 요양시설의 면회재개정책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이에 힘을 입어 간병인의 삶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소명을 안고 글을 써야겠다는 욕망이 타오른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진달래 꽃에 담아 쓰기도 하고 코로나 전의 일상이 그리워 벚꽃 사랑도 쓰다 보니 쓰고 싶은 글이 수없이 많아진다. 내 기억속의 후미진 곳에 숨어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죄다 꺼내서 써야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내가 글 쓰는 이유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다. 글을 쓰면서 위로 받고 즐거움을 향수해 본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길거리에 뛰쳐나가 만세라도 부를 듯이 환성을 올릴 수 있을 날을 상상해보면서 오늘도 병원옥상의 하늘 정원~ 나의 서재에서 걷고 또 걷는다. 새로운 글을 구상하면서...
/김선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