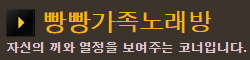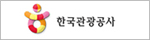엄마의 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1-06-16 07:26 조회1,460회 댓글0건본문
1984년이였다. 내가 열네 살 때, 우리 농촌 마을에서는 호도거리 책임제를 시작했다. 집체로 농사를 짓던 밭을 개인으로 전부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 집에는 학교 뒤 신작로 아래에 위치한 뙈기밭이 차례지게 되였다. 길이, 너비도 같지 않고 경사가 진데다가 돌들이 많아서 돌밭이라고 불리는 3등지였다.
밭을 가지고 나서 내가 처음 그 밭에 가보았을 때였다. 엄마는 혼자 말처럼 "어찜 우리 집에 이런 밭이 차례졌을까?, 논밭도 제일 대사 쪽으로 물이 미처 가지 못하고 논두렁이 많은 곳이 차례져 가지구, 외양간의 소도 제일 비달비달 한 똥물싸개 소가 차례지구, 말로는 제비를 뽑아서 나눈 거라 고 하지만 이게 정말 그런 건지 생각할수록 분하다. 썩어질 것들이 자기네들은 다 좋은 밭을 가지고 어쩜 우리는 이런 걸 주나?" 하고 사설을 하셨다. 엄마 얼굴은 분노가 차올라 벌겋고 서러운지 눈물까지 핑- 돌아계셨다.
그러더니 나를 보며 말했다.
"너는 이러 길래 공부를 잘해야 된다, 앞으로 어찌 이렇게 농사를 지으며 한평생 살겠니?"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대답은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이튿날부터 엄마는 밭에 가서 그 많은 돌들을 주어내시기 시작했다. 엄마는 다섯 살 때 홍진을 앓았는데 그 미열로 귀가 어두웠고 몸도 아픈 데가 많았다. 외할아버지가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한 관계로 집체 때는 그나마 대대에서 돌봐줘서 쉬운 일을 했었다. 집체 때 엄마가 하던 일은 화건종 담배조리나 넓은 골목이나 집체호 마당에 길게 비닐을 펴고 거기에 검정귀 버섯이랑 말리며 닭들이 접어드는 걸 쫓는 일이였다.
하지만 호도거리는 그런 엄마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개인으로 밭을 나누고 대대에서 공용으로 기르던 집짐승도 다 나누면서 각자 제 살길을 도모해야 했으니 엄마 역시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하는 '자력갱생'의 길로 내몰리게 되었다. 정책이 그러하니 엄마는 급작스럽게 닥쳐온 시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남들과 똑같은 노동력이 되어 밭일을 해야만 했다. 아이 둘을 키워야 하고 본인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말이다. 친척이라도 있으면 좀 도와주련만 우리는 동네에 친척 하나 없었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몹시 불안했다.
농사는 계절을 타기 때문에 그에 맞게 심고 거둬들여야 했다. 나는 엄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 학교가 끝나면 밭에 가서 돌을 줏는 일을 도왔다. 돌이 어찌나 많은지 걷어내고 걷어내도 밭갈이나 후치질을 하게 되면 또 돌들이 올라오고 정말 끝이 없었다. 나도 방과 후나 일요일에는 호미를 들고 밭에 가서 엄마와 함께 일했는데 기음을 매다보면 호미에 돌이 묻어 올라와 호미가 돌에 긁히는 소리가 애처롭게 들렸다.
학교 바로 뒤에 있는 밭이라서 엄마는 학교운동장을 거쳐서 돌밭을 오가군 했다. 나는 학교운동장에서 뛰놀다가 엄마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엄마는 오늘도 또 얼마나 무거운 돌들을 많이 메어 날랐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아픈 몸으로 고생하시는 엄마가 한없이 불쌍해 났다. 그 돌밭을 엄마는 장장 5년을 가꾸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대야에 담거나 보자기에 싸서 걷어낸 돌들이 어림잡아도 몇 트럭은 될 것 같다. 언젠가 내가 가서 둘러봤을 때도 밭이 확연히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 말이다.
엄마는 그 뙈기밭에서 주어낸 돌들로 밭 둘레에 둥그렇게 담도 쌓아 놓았었다. 엄마 힘으로는 벼와 콩 옥수수만 심어도 힘든데 엄마는 고집을 부리면서 그 뙈기밭에 돈이 되는 화건종 담배를 심었다. 돈을 벌어서 남들 못지않게 자식들을 잘 입히고 잘 먹이려는 것이였다. 그 뙈기밭은 가물이 드는 해에는 돌밭이라서 수분이 쉽게 빠지고 돌에 열이 올라 담배 모들이 말라죽어서 몇 번 씩이나 보식을 해야 했다. 그나마 장마가 드는 해에는 여느 밭보다는 빗물이 잘 빠지는 장점이 하나 있긴 했다.
엄마는 또 신작로 쪽으로 밭을 야금야금 뚜져서 넓히시고 거기에 마늘이며 올감자를 심었다. 그리고 밭에 나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서 돌을 주어내고 풀뿌리를 걷어내고 이것들을 심었더니 정말 잘 자란다며 흡족해하셨다. 담배 모가 빈 곳에다는 또 토마토를 심어서는 담배 잎을 따다가 목이 마를 때면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따서 드시기도 하셨다.
그 돌밭을 가져서부터 꼭 5년 뒤, 엄마는 지병으로 세상을 뜨셨다. 그러니 엄마는 그 돌밭을 가꾸다가 생을 마감한 셈이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엄마가 돌밭의 돌들을 주어내던 생각이 제일 먼저 났다. 그 많은 돌을 주어내며 너무 고생해서 몸이 견뎌내지 못하고 병이 든 것 같아 가슴이 미여질 것 같았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도 수십년 세월이 흘렀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 열아홉 살 철부지였던 나도 이제 반백의 나이가 되였다. 엄마가 48세에 돌아가셨으니 나는 엄마보다 더 많이 살았다. 해마다 청명하고 추석이면 나는 그 뙈기밭 바로 우로 길을 낸 신작로를 통해 엄마의 산소를 다니고 있다. 그곳을 지나 갈 적이면 나는 이제는 누가 다루는지 알길 없는 뙈기밭을 자꾸 바라보게 된다. 그 뙈기밭을 바라보노라면 오래전 기억이지만 햇볕에 까맣게 타서 돌을 주어내던 엄마의 얼굴이 너무나도 또렷이 떠올라서 마음이 무거워진다.
아픈 몸이지만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낮에는 밭에서 죽을 힘을 다해 일하고 밤에는 잠결에도 자꾸 신음소리를 내던 우리 엄마, 그때는 엄마의 몸이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줄을 몰랐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도 나는 몰랐다. 나이 오십이 되여서야 나는 비로소 알 것 같다. 결국 자식들이 엄마의 가장 크고 무거운 돌이였음을 말이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내려 놓을 수 없기에 당신 몸이 부서지면서라도 끌고 가고 안고 가야 했던 돌이였음을 말이다.
혹여라도 하늘에 계신 엄마가 들을 수 있다면 엄마에게 말하고 싶다. 임종 직전까지 너희들 어찌 살아가겠냐 걱정하던 엄마의 자식들은 모두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보다도 더 나이를 먹었고 결혼하고 자식 낳아 기르면서 남만큼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이제 그 무거운 돌들을 어깨에서 가슴에서 내려놓으시고 부디 홀가분하게 지내시라고 말하고 싶다.
/최영일
1971년생, 길림성 화룡시 로과, 리수 출생. 현재 연길에서 치과병원 운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