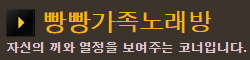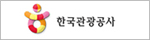나눔의 행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1-10-17 21:10 조회1,440회 댓글0건본문
아파트가 살기는 편하지만 이웃 간에 어딘가 마음의 담 벽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
나도 갓 층집으로 이사 왔을 때 옆집끼리 서로 마주쳐도 냉냉했다. 그리고 우리 집 아래 위층은 모두 한족들이였다.
어느 날 저녁, 잠을 자야할 때가 되였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고요한 밤에 소리높이 전화를 하기에 잠들 수 없었다. 내가 나가서 소리를 낮추라 말 하자고 하니 아내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다.
“당신은 한족말도 잘하지 못하기에 한족들과 시비를 걸지 마세요.”
“아니, 그럼 죽은 듯이 가만 있어야 하오?.”
“-------”
이렇게 그날은 그렇게 참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내가 없는 저녁, 누군가 또 조용한 복도에서 한족말로 높은 소리로 전화하는 것이였다. 듣다못해 내가 문 열고 나가보니 위층 복도 굽이에서 전화소리만 들려오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전화하는 소리를 들어봐선 누구와 전화로 다투는 것 같았다. 내가 좀 소리를 낮추라고 권고했지만 소용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나는 복도에서 웃통을 벗어서 배와 윗몸 모두가 알몸이 드러난 키 크고 뚱뚱하며 검스레한 한족사람과 마주쳤다.
이에 나는 놀란 기색으로 “아이.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모습인가요?”하고 말을 건네자 그는 빙그레 웃으며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도 그를 보고 부드럽게 말했다.
“복도는 공공장소이기에 여인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들이 보면 꼭 나보다 더 놀랄 수 있어요. 그러니 이후부터 옷 입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층집에서 사니 많은 사람들에게는 할일이 없어져 활동량도 크게 줄어들어 모두들 각종 운동에 열을 올린다. 나도 남들처럼 아침저녁으로 걷기를 하던 중 한국에 나가 있는 지인들의 묵은 밭이 우리층집 부근에 있기에 내가 그 밭을 다루게 되였다.
아침에 깨여 나선 그 밭에 나가 땅을 뚜지며 상추, 오이, 파, 가지 등 채소들을 가꾸니 걷기 운동하기보다 더 시원하고 아침밥 맛도 좋았다. 이렇게 채소농사를 해보니 농사는 철이 있다는 말처럼 채소는 제때에 뜯지 않아 3-4일만 지나도 먹을 수가 없었다. 하여 나는 채소를 버리기도 아깝고 하여 부근의 아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어느 하루, 나는 채소를 지인에게 주러 가는 도중 위층의 그 한족하고 마주쳤다.
“어디로 가요?”
그는 채소를 보면서 물었다
“친구한테 채소를 가져다주려고요”
“밭을 얼마나 다루기에 남까지 줘요? 그 채소 참 맛 있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그가 채소를 부러워하는 것이 뻔했다.
“내일 당신에게도 줄게요”
이튿날 아침, 밭일을 마치고 나서 나는 채소를 한 묶음을 가지고 위층에 올라가 문을 두드리니 그의 아내가 문을 열었다. 내가 맛이나 보라며 주니 그의 아내는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 후에도 또 채소를 가져다주면 그의 아내는 내가 싫다는 것도 마다하고 기어이 삶은 소 발쪽 하나를 넘겨주었다.
그 후부터 그들과 복도에서나 어디에서나 만날 때마다 그들이 먼저 머리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네왔다.
샘물(광천수)을 자주 긷는 내가 물통을 들고 계단을 오를 때나 또 무거운 쌀 주머니를 들고 오를 때 복도에서 그들과 마주칠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그도 그의 아내도 나의 사양소리도 아랑곳 하지 않고 몇십근 되는 물통이며 쌀 주머니를 들고 나의 앞에서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가 5층에 있는 우리 집 문 앞에 가져다 놓곤 하였다.
한마디로 우리는 서로 성도 이름도 모르고 민족도 다르지만 인젠 서로 도우며 사는 사이좋은 이웃이 되였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 간다더니 우리사이에는 어느새 우정과 사랑의 아름다움이 펼쳐졌다.
그렇다! 사람마다 서로 자그마한 사랑이라도 주고 받는다면 인간세상은 더없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길림성 왕청현 김시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