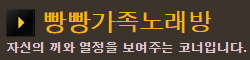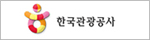닭똥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1-11-26 14:34 조회1,480회 댓글0건본문
지난 토요일 친정 올케가 반찬을 해서 가져왔다. 코로나로 간병일에 지쳐가는 시누이를 걱정해서 먹을거리 푸짐히 챙겨다 주는 올케가 고맙다. 어쩌다 쉬는 휴일임에도 손위시누이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이 참 갸륵하다. 알뜰하고 솜씨가 좋은 올케가 한국에 와서 요리학원도 다니고 한식요리사 자격증도 따면서 한식을 배운터라 음식을 제법 잘 만든다.
지난 봄에는 열무김치를 먹고 싶다고 했더니 아주 맛있게 담가서 가져왔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닭똥집 볶음이랑 보쌈이랑 정성스레 만들어 왔다. 닭똥집 볶음을 맛나게 먹노라니 어릴 적 생각에 혼자 웃음이 나왔다.
나의 아버지와 엄마는 양가의 막내들로서 닭 모가지 하나 비틀지 못하는 위인들이였다. 소학교 4학년 때 쯤부터 닭 잡아 손질하는 일을 계집애인 내가 맡아했다. 닭털 뽑기도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가죽까지 훌렁 벗겨지고 덜 뜨거우면 잔털이 빠지지 않아 골치 아프다. 하다 보니 노하우가 생겨서 제법 물 온도를 적당히 해서 닭털을 깨끗하게 잘 뽑고 알뜰하게 손질할 수 있었다. 엄마는 웬간한 어른보다 낫다고 칭찬해 주셨다. 내가 닭을 살상해서 뜨거운 물에 튀겨 털 뽑고 깨끗이 씻어 엄마에게 드리면 엄마가 맛있게 끓여주었다. 나는 어릴 때 좀 담찼다고 한다. 말하자면 겁이 없었다. 산에 가면 애들은 묘지를 피해서 도망치듯 하였지만 나는 묘지에 핀 꽃도 따 오군 하여 애들한테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닭 잡으면 똥집은 항상 내 차례였다. 언젠가 작은 아버지가 오셨을 때의 일이다. 고기나 생선은 구매증으로 제한된 량만 살수 있었던 시기라 집집이 귀한 손님이 오면 키우던 씨 암탉을 밥상에 올리군 하였다. 작은 아버지의 왕림으로 우리 집 암탉은 그날 저녁상에 올랐다. 엄마가 가마솥 뚜껑 여는 소리에 나는 쪼르르 도마 옆에 쪼그리고 앉아 대기하고 있었다. 엄마는 언제나 삶아진 닭을 꺼내기 전에 닭똥집부터 찾아서 얇게 썰어 나에게 주었다.
나는 도마에서 한 조각씩 소금에 살짝 찍어 날름날름 먹군 했었다. 그날도 냠냠 짭짭하며 닭똥집의 쫄깃한 육질의 감칠맛을 즐기며 맛있게 먹었다. 닭똥집은 적당히 익혀야 육질의 쫄깃하고 사각사각하는 맛을 즐길 수 있는데 그 맛이 별미다. 지금도 그 맛이 잊혀지지 않는다.
밥상 받으신 작은 아버지께서 "형수님 닭똥집이 안보이네요. 똥집주세요" 한다.
엄마와 나는 시선 마주치고 멋쩍게 웃었다.
"작은 아버지 저희 집 닭은 똥집이 없는 닭이였어요. 그래서 똥집이 없어요."
나의 순발적인 유모도 아닌 엉뚱한 대답이였다. 무슨 소리야 하는듯한 작은 아버지의 표정에 엄마가 말씀하셨다.
"우리 집 닭똥집은 닭이 익기도 전에 둘째의 뱃속으로 들어가요. 애가 똥집을 너무 좋아해요. 푹 익으면 맛 없다고 적당히 끓이면 똥집을 먼저 꺼내서 먹는 답니다. 호호"
그렇게 먹던 닭똥집에 대한 나의 집착은 지금도 여전하다. 어렸을 때 엄마가 챙겨주던 닭똥집을 오늘은 올케가 챙겨준다. 세월의 연륜이 느껴져 씁쓸하면서도 따뜻함의 대물림으로마음이 훈훈해진다.
올케, 고마워요. 힘낼게!
/김선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